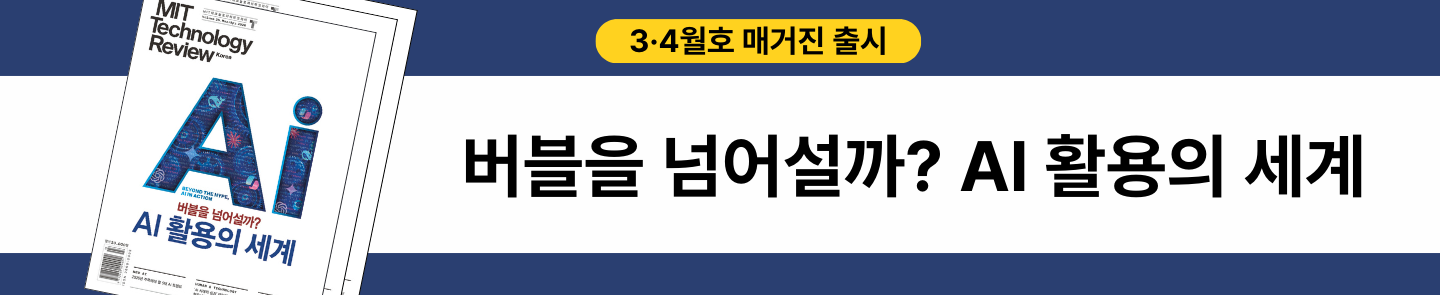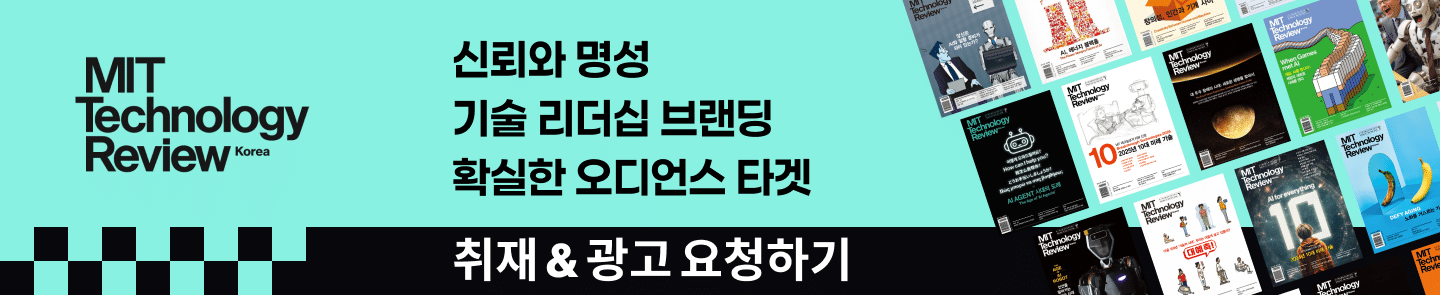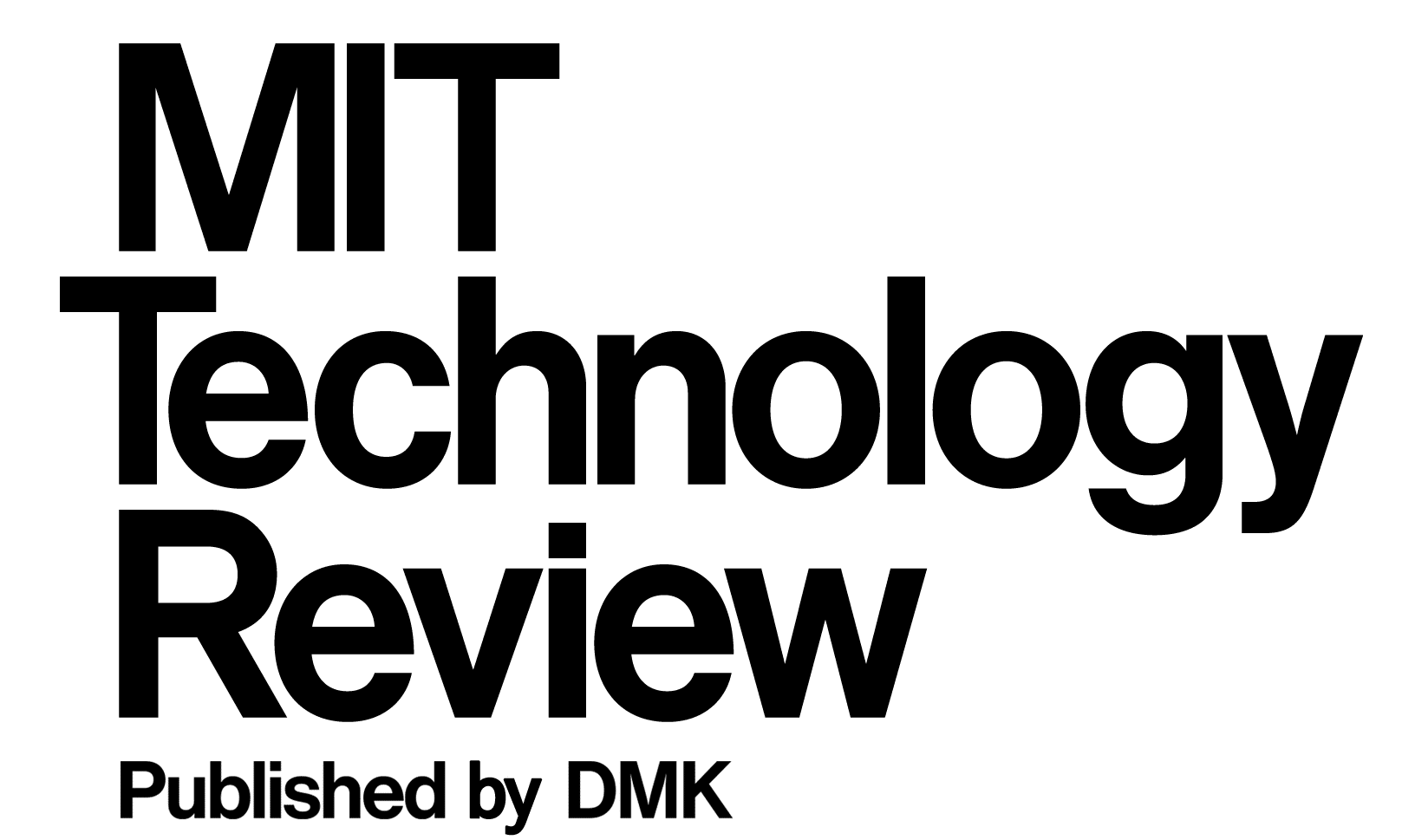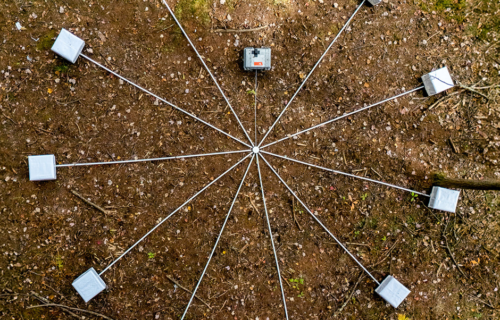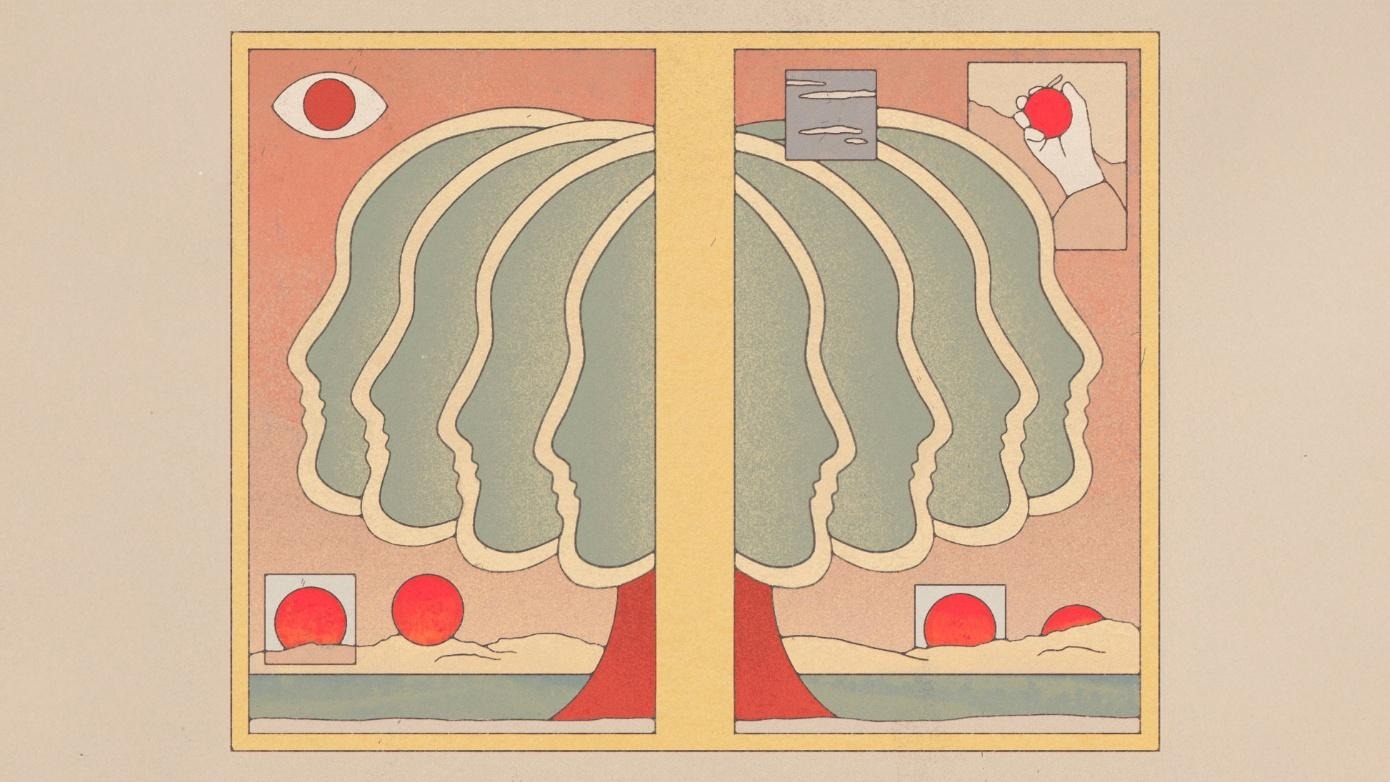
감정도 신조어처럼 생겨난다?
‘벨벳미스트(velvetmist)’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벨벳미스트는 편안하고 고요하면서, 마치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섬세한 감정을 말한다. 평온하다는 점에서는 만족감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가볍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해 질 무렵의 풍경을 바라볼 때나, 차분하고 절제된 음악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거나 아예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사실 이 단어는 온라인 포럼 레딧의 ‘noahjeadie’라는 사용자가 챗GPT를 이용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감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함께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절한 에센셜 오일과 배경음악만 있다면 누구나 “라벤더 향이 감도는 교외를 유유히 떠다니는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유령”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웃어넘길 이야기는 아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감정들(neo-emotions)’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감정의 새로운 차원과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2025년 7월에 발표된 한 학술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다루며 ‘벨벳미스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 등장한 감정들 대부분은 감성적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감정 연구자들의 중대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세계에 반응하면서 새로운 감정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