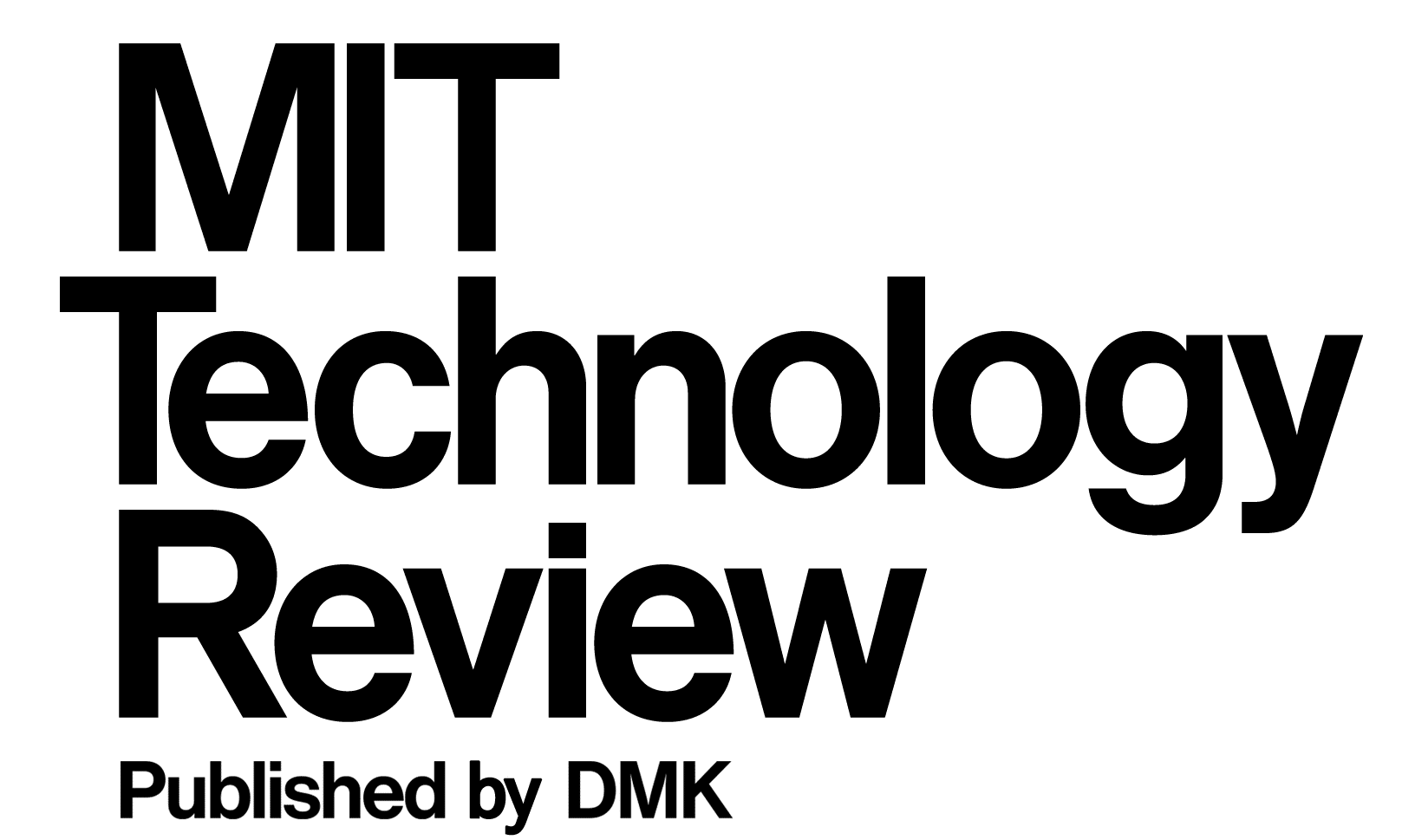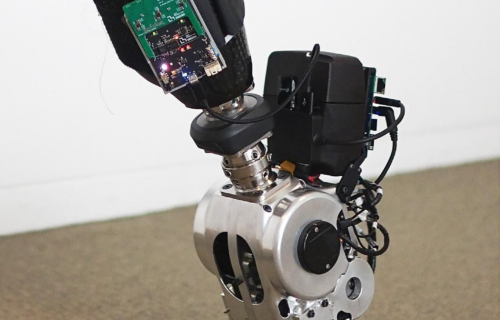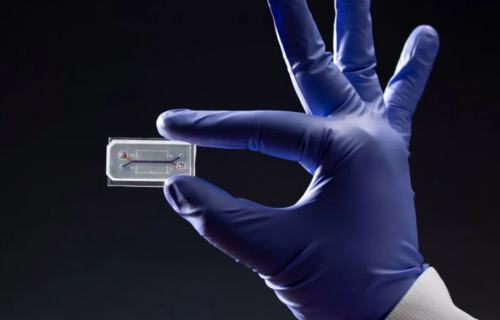KEVIN FRAYER/GETTY IMAGES
China is suddenly dealing with another public health crisis: mpox
‘엠폭스’라는 또 다른 위기가 중국을 덮치다
코로나19에 비할 정도로 엠폭스가 크게 확산된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그때와 같은 실수를 일부 반복하고 있다.
방호복, PCR 검사, 격리, 접촉자 추적. 7월 마지막 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중국 CDC’)가 질병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을 때 기시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 지침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질병은 잠재적으로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질병인 ‘엠폭스(mpox,이전 명칭은 ‘원숭이두창(monkeypox))’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내의 엠폭스 확진자 수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질병 확산을 억제하려면 중국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22년 중반에 시작됐던 엠폭스 확산세가 대체로 잠잠해졌지만, 이제는 아시아가 엠폭스의 새로운 확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산발적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했던 일본, 한국, 태국에서는 2023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WHO에 보고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개월 동안 315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 게다가 중국의 확진자 수 보고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내의 실제 엠폭스 확산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