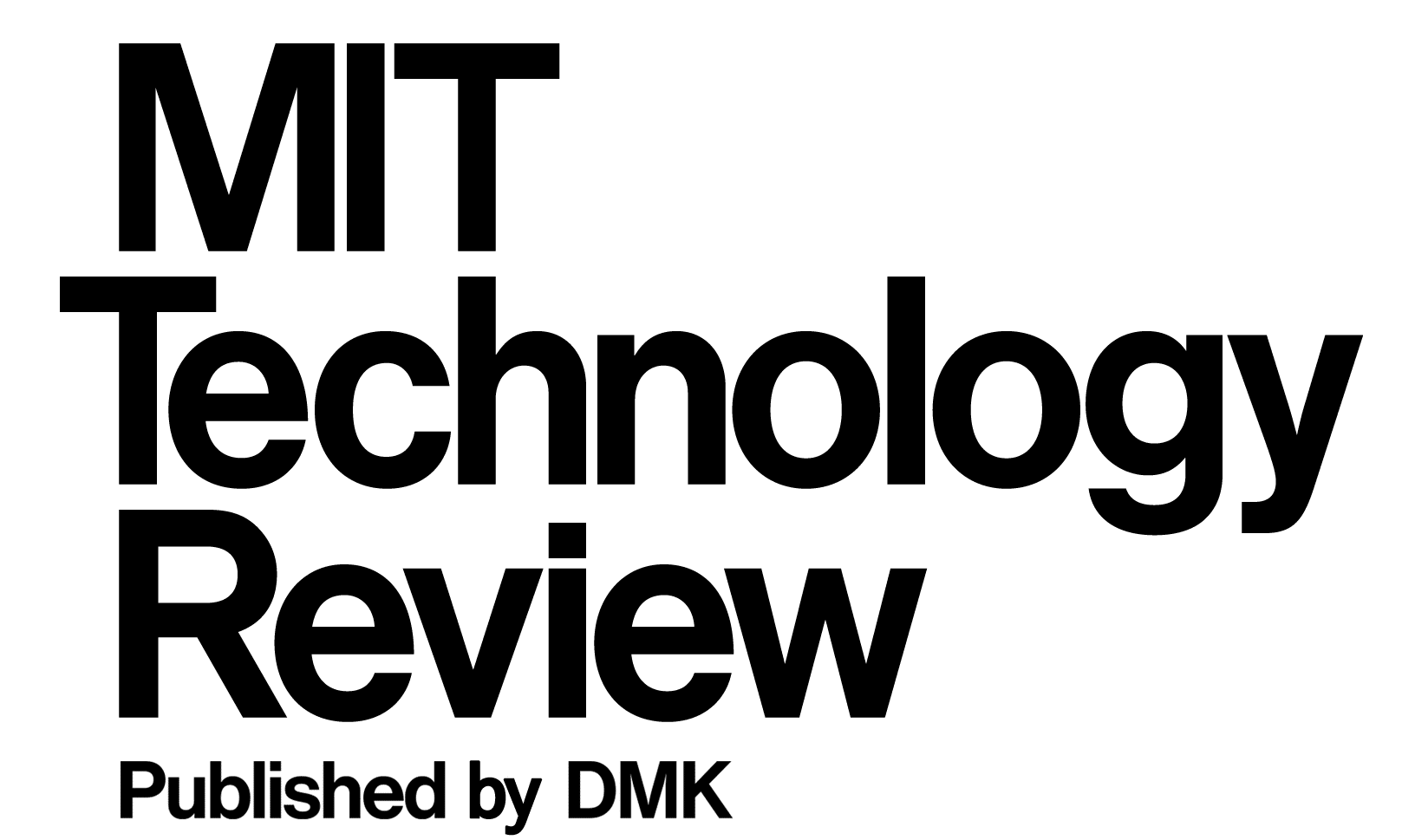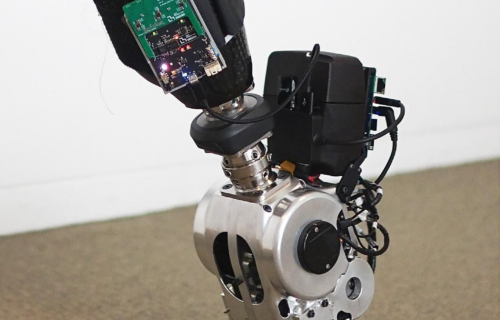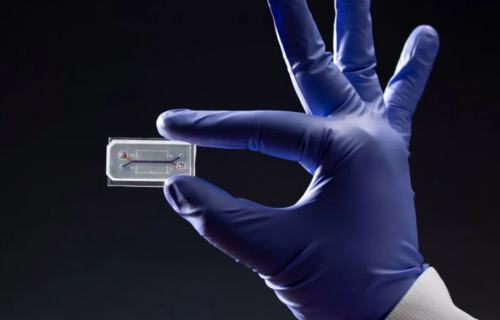ILLUSTRATION: STEPHANIE ARNETT/MITTR; PHOTO: GETTY
How CRISPR could help save crops from devastation caused by pests
미래의 농장 몰락을 막을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편집 곤충을 이용하면 살충제 의존도를 줄이고 수조 원 규모의 과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역에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스티브 매킨타이어(Steve McIntyre)는 포도나무가 걸리는 ‘피어스병(Pierce’s Disease)’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1998년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형제의 귤∙아보카도 농장을 방문했을 때 마주친 광경은 그에게도 낯설었다. 피어스병은 오래전부터 캘리포니아에 존재해왔다. 이 병에 걸린 포도나무는 잎이 시들고 열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다. 그러나 그의 형제 농장 인근에서 목격한 모습은 뭔가 달라 보였다.
매킨타이어는 과수원이 “초토화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포도나무들은 마치 관개시설이 완전히 끊긴 것처럼 바짝 말라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매킨타이어는 농지를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의 포도밭 역시 조만간 닥칠 불행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침입종으로 매미충의 일종인 ‘글래시윙샤프슈터(glassy winged sharpshooter)’는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발견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피어스병의 병원균을 작은 골칫거리에서 악몽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길쭉한 몸통에 스테인드글라스같이 붉고 투명한 날개가 달린 글래시윙샤프슈터는 토착종 샤프슈터보다 더 멀고 빠르게 날 수 있다. 또한 단단하고 질긴 포도나무에서도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짐작으로 198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에 유입된 글래시윙샤프슈터는 피어스병을 급속하게 퍼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