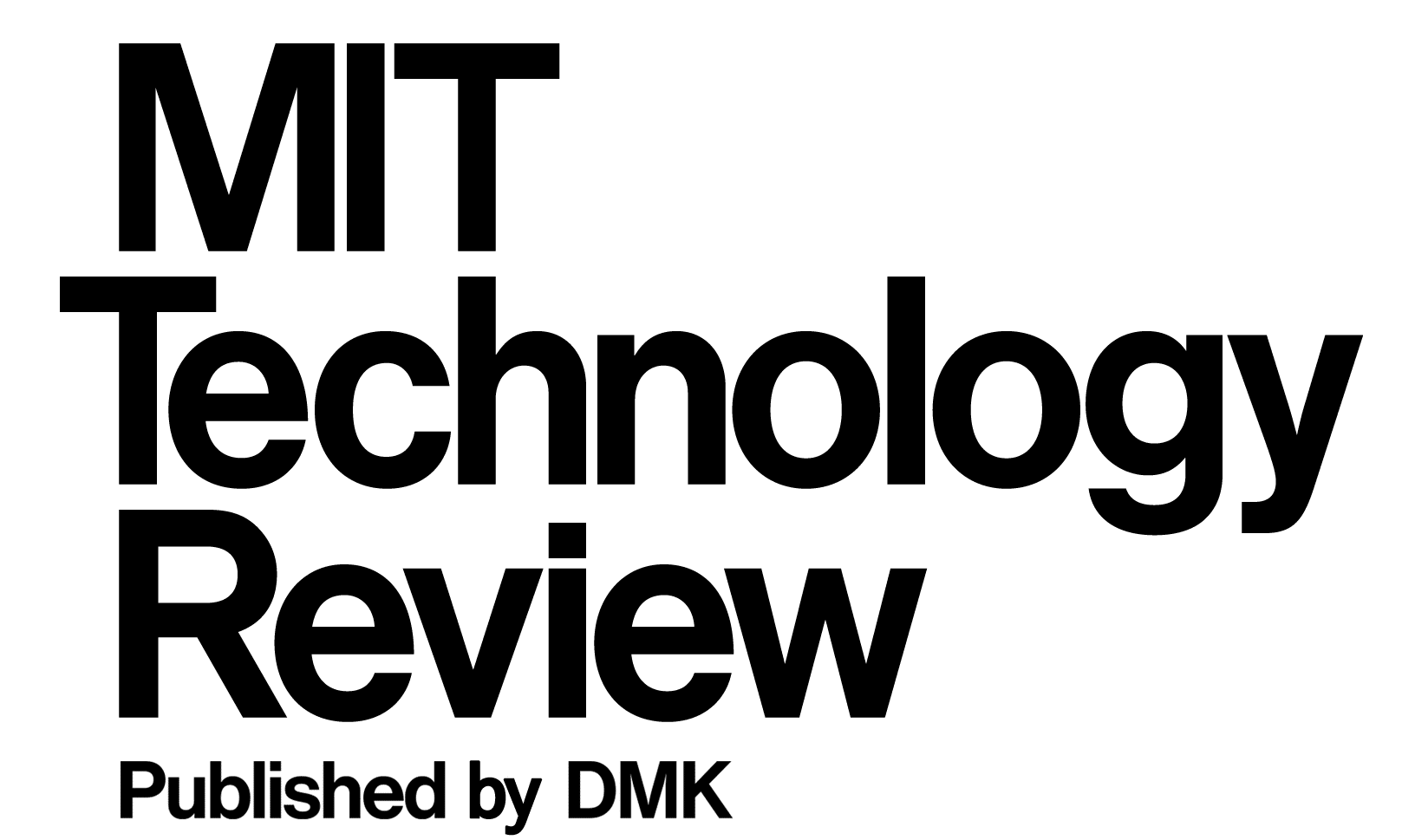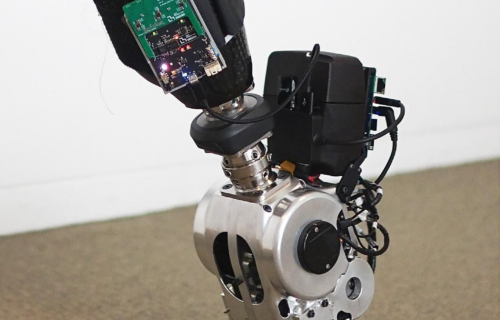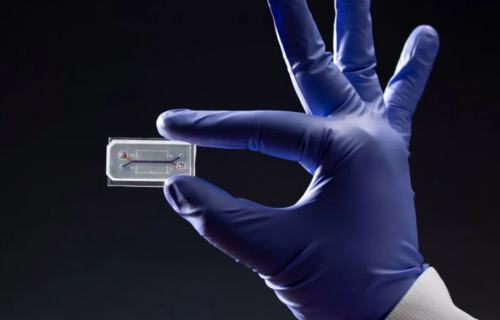GETTY IMAGES
The quest to re-create nature’s strongest material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소재를 재창조하기 위한 탐구
삿갓조개 이빨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소재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인공 소재만큼 내지 그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랫동안 거미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생물학적 소재로 인정받았고, 전 세계 연구자와 스타트업들은 여기서 영감을 받아 인공 거미줄 생산에 나섰다. 하지만 얼마 전 거미는 서유럽 해안을 점령한 삿갓조개에게 가장 강력한 소재를 만드는 생물 자리를 내줬다.
바위 지역에 붙어사는 삿갓조개는 치설(齒舌·radula)로 바위에 난 흔적을 긁어낸다. 치설은 부족류를 제외한 연체동물(Mollusca)의 구강에서 볼 수 있는 톱 비슷한 줄 모양의 대상물로 키틴질(chitinous substance)로 된 작은 이빨이 많이 붙은 혀를 말한다. 치설은 구강에서 내밀어 먹이를 긁어내는 일을 한다. 키틴질은 갑각류나 곤충류의 외골격 또는 단단한 피부를 형성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삿갓조개 이빨의 강도가 높다는 걸 진작부터 짐작할 수 있었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그것의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재료가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를 측정해 객관적 수치로 표시할 수 있었다. 결과는 약 5기가파스칼(Gpa)로 모든 천연 재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삿갓조개의 이빨이 놀라운 기계적 특성을 띨 수 있는 건 곤충과 갑각류 같은 유기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틴(chitin)으로 된 유연한 지지체가 산화철의 일종인 침철석(goethite) 나노 결정으로 강화된 복합 구조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