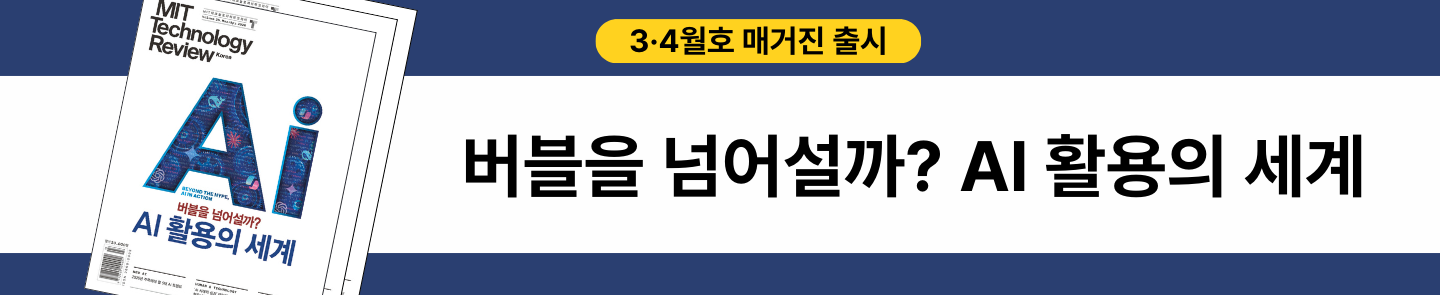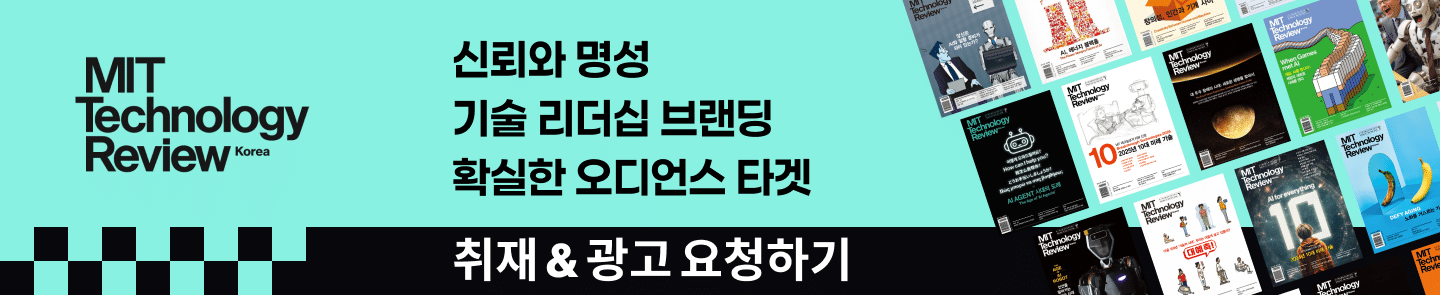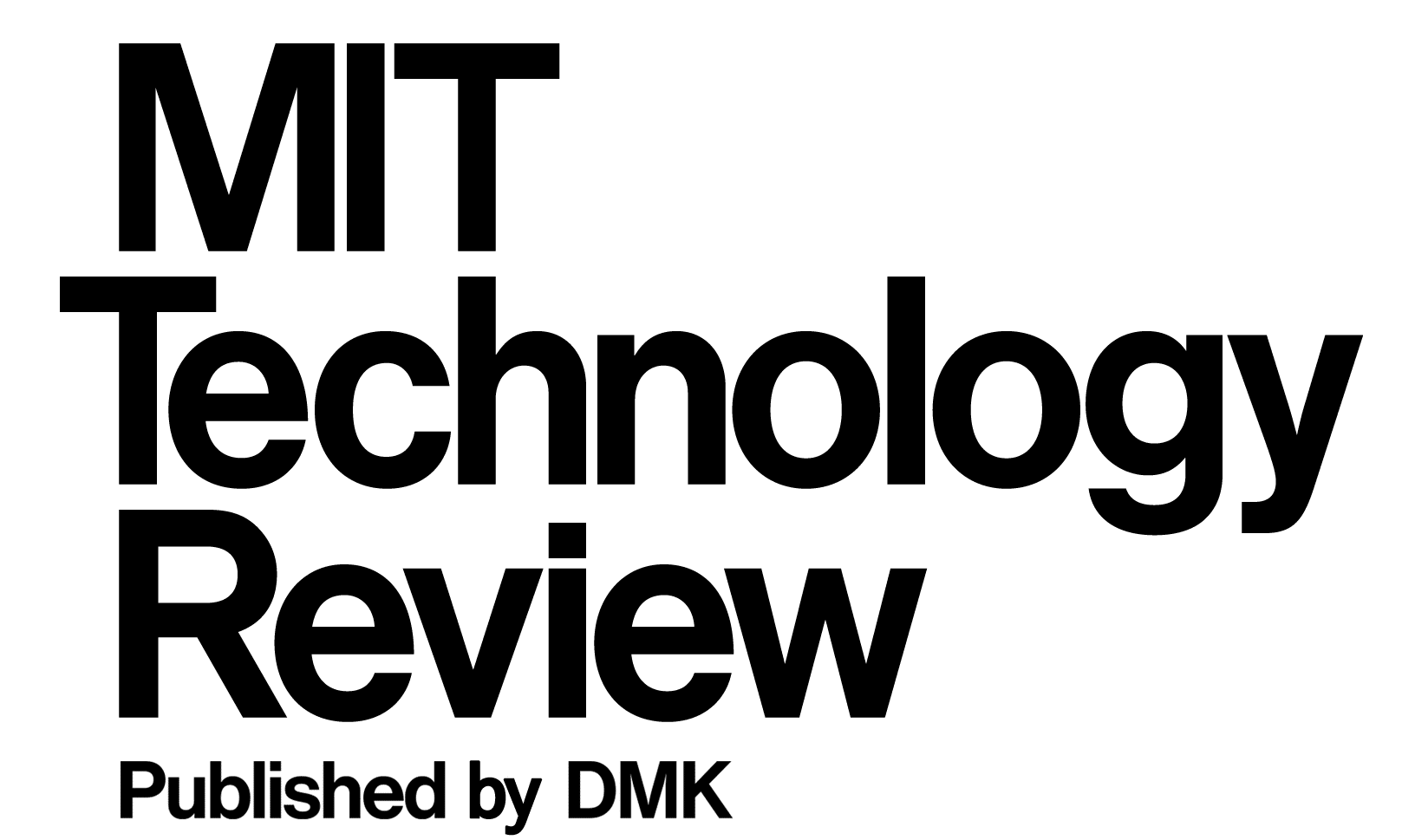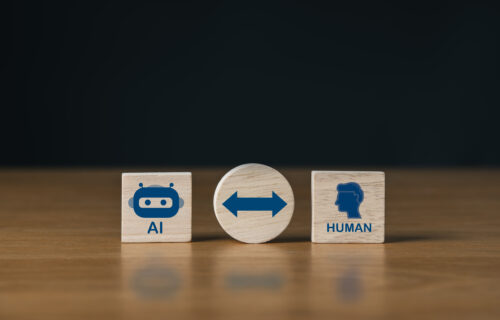SARAH ROGERS/MITTR | GETTY IMAGES
[OPINION]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AI 주권
한국 등 여러 국가가 ‘AI 주권’을 내세워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완전한 자립은 불가능하다. 결국 승부는 전문화와 전략적 협력에 달려있다.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1조 3,0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가 자국의 AI 역량을 직접 통제하는 ‘소버린(주권형) AI’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서다.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자국 내에서 학습한 모델 개발,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체계 투자도 포함된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세계가 겪은 충격과도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망이 무너진 데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각국이 ‘자국 중심’ 전략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 자율성을 향한 전략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AI 공급망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칩은 미국에서 설계되고 동아시아에서 제조된다. 모델은 여러 나라에서 수집된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학습하며, 애플리케이션은 수십 개 관할권에 걸쳐 배포된다.
주권이 여전히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어적 자급자족 모델에서 벗어나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국의 자율성과 전략적 협력 함께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중심의 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프라 중심 전략의 한계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관의 62%가 소버린 AI 솔루션을 찾고 있다. 기술적 필요보다 지정학적 불안감이 주요 배경이었다. 이 비율은 덴마크에서 80%, 독일에서 72%까지 높아진다. 유럽연합(EU)은 ‘기술 주권’을 담당할 첫 집행위원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