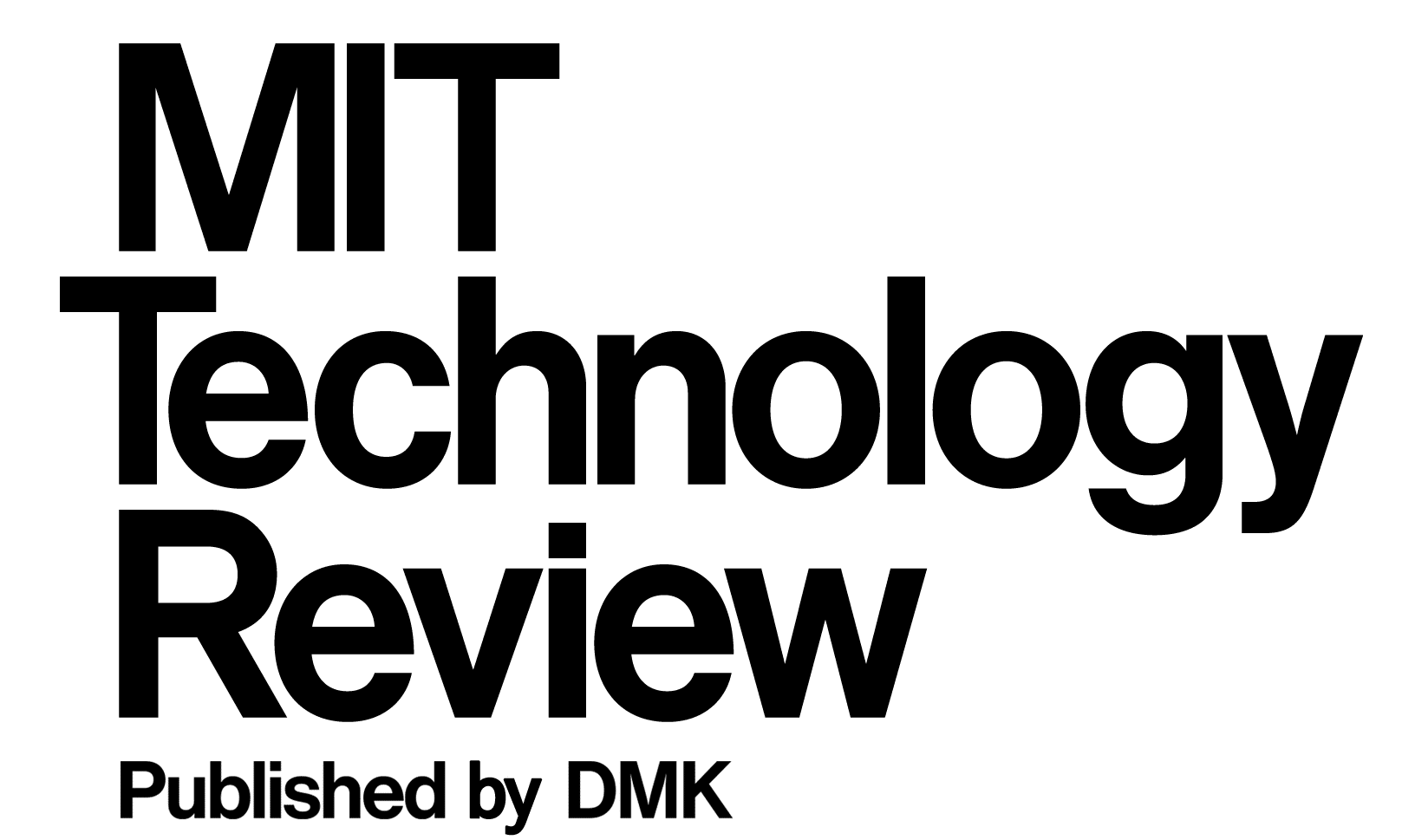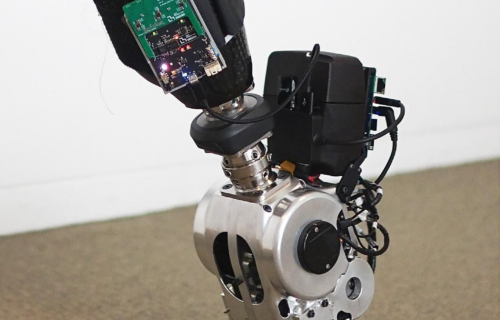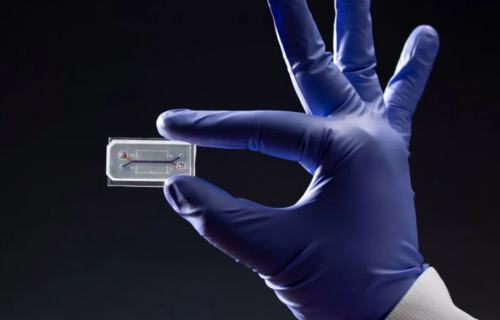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더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을 개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과학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치료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제한적이며, 질병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유한 국가에서 예방접종률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을 빠르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바이러스는 백신 보급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백신이 충분하게 보급된 국가에서조차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질병의 모든 단계에 대한 치료법이 필요하다.” ‘외면받는 질병을 위한 약제 개발 계획'(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 DNDi)의 북미 담당 이사(executive director)인 레이첼 코헨(Rachel Cohen)이 말한다. 이 단체는 예전부터 주요 제약사들에 의해 무시 받아온 질병들에 대한 치료 약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감염성 질환에 맞서 싸울 때 한가지 방식만으로 효과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코로나19 치료 약제들은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 입원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병실이나 중환자실이 부족한 지역에서 약제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다고 코헨은 말한다. 또한 이 약제들은 입원한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