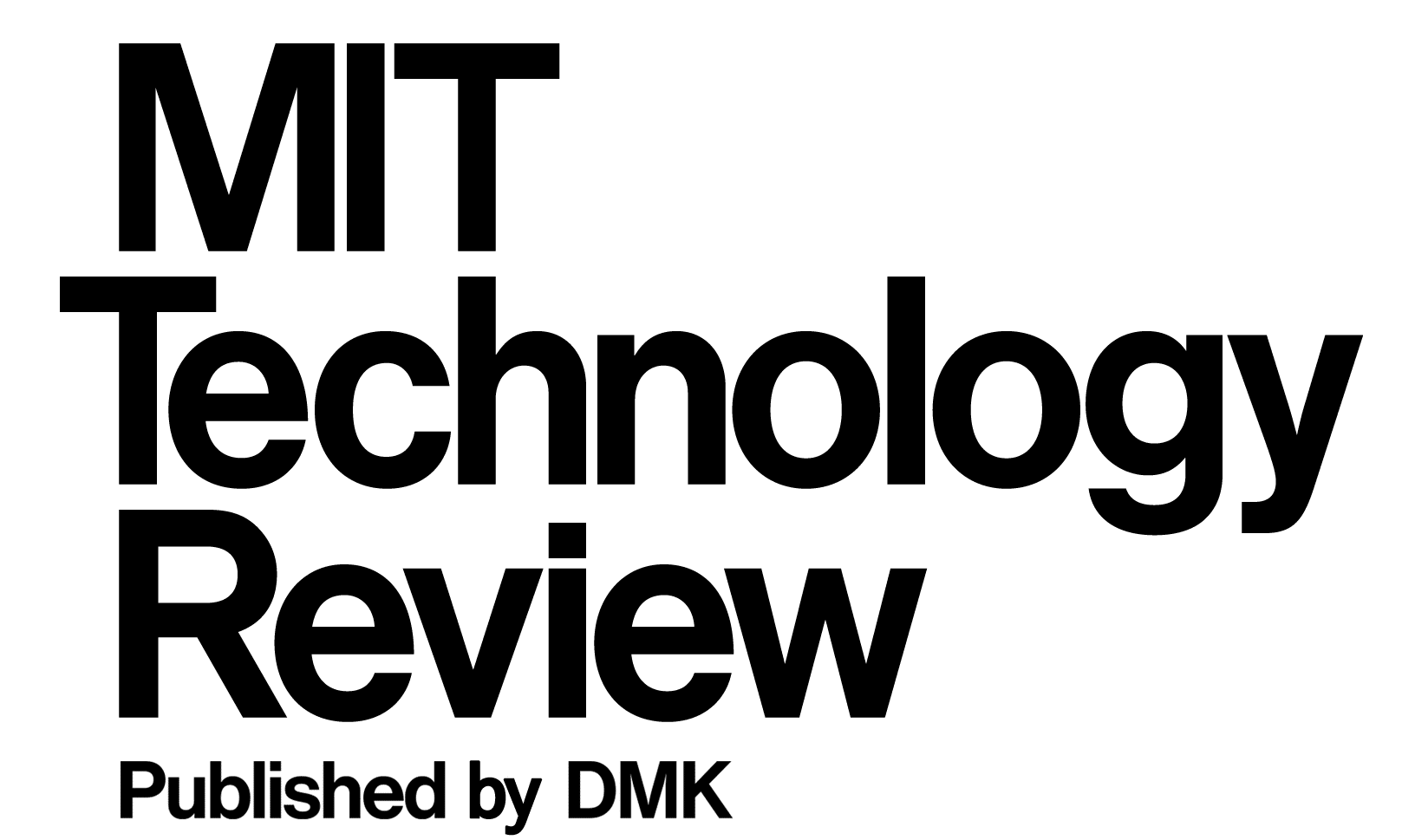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P PHOTO/TSVANGIRAYI MUKWAZHI
Zimbabwe’s climate migration is a sign of what’s to come
짐바브웨의 기후 이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205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수천만 명이 기후 변화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가 시작되었다.
줄리어스 무테로(Julius Mutero)는 지난 6년 동안 거의 수확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 짐바브웨 동부의 농촌 지역인 마비야(Mabiya)에서 3만 제곱미터(㎡)의 땅을 경작해 왔다. 무테로는 이곳에서 자신과 아내, 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옥수수와 땅콩을 재배하며, 남은 분량은 현금 마련을 위해 모두 판매한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마비야 지역의 강수량이 줄고 강이 마르기 시작했다. 이미 평균 기온이 30°C 정도였던 이 마을의 여름 기온이 37°C까지 오르는 날이 잦아졌다. 이제 마비야의 우기는 11월 초에서 12월 말로 미뤄졌고, 기간은 더 짧아졌다. 가장 건조한 계절에는 가시덤불만 남은 농지에 먼지가 날린다.
무테로의 농작물은 수년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 말라 죽었다. 그는 수확 기간이 짧은 옥수수 품종을 심어봤지만, 그마저도 살아남지 못했다. 가축을 기를 목초지도 없어 무테로는 소 일곱 마리가 죽는 것을 힘없이 지켜봐야 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말한다. 무테로의 가족은 비영리단체나 짐바브웨 정부가 제공하는 식량 지원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테로는 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운 좋게도 지역의 한 전통 지도자가 무테로에게 마비야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이스트 하일랜드(East Highlands)에 있는 작은 부지를 약속했다. 이 땅은 다른 지역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짙게 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