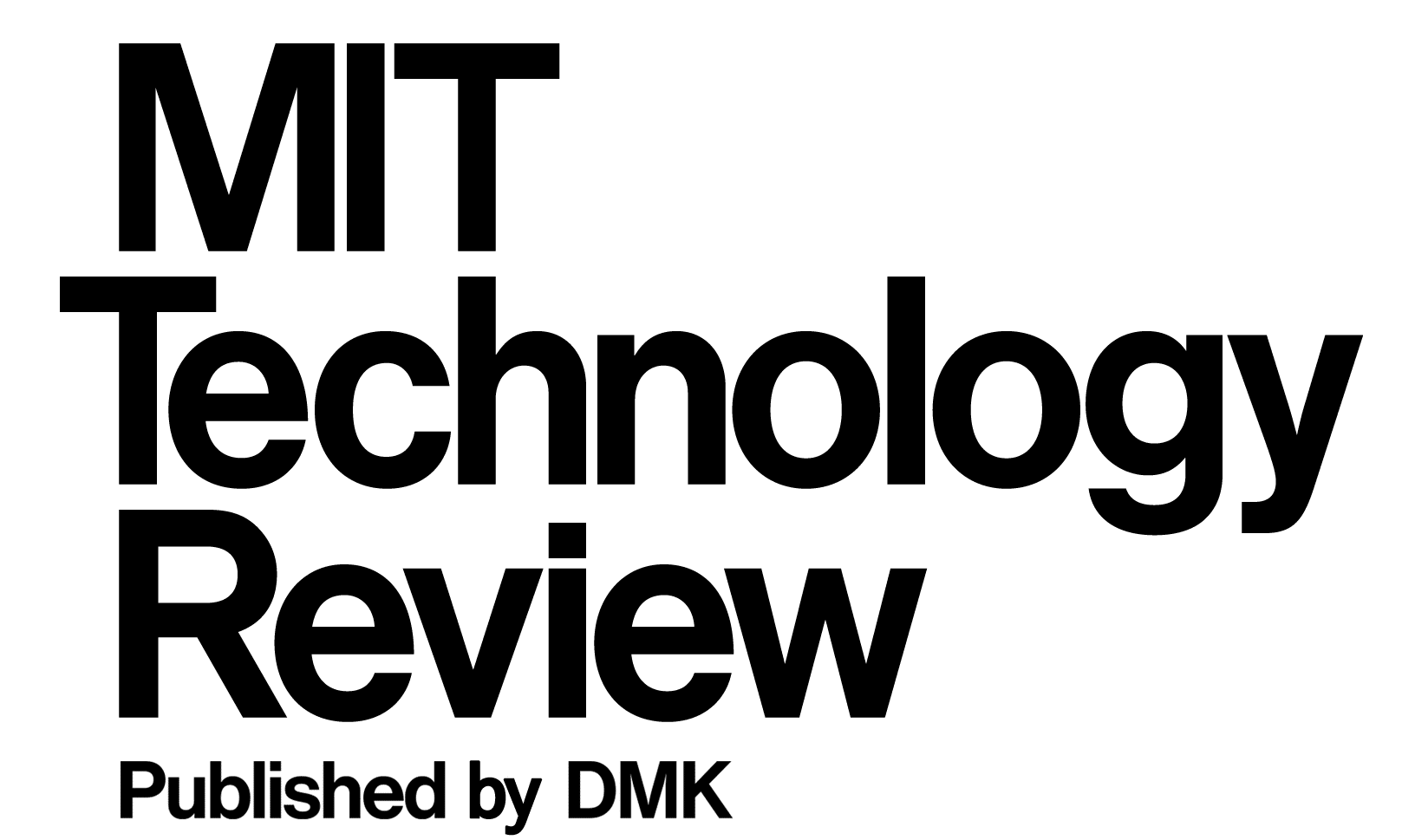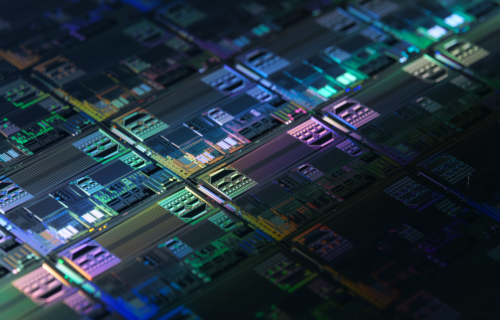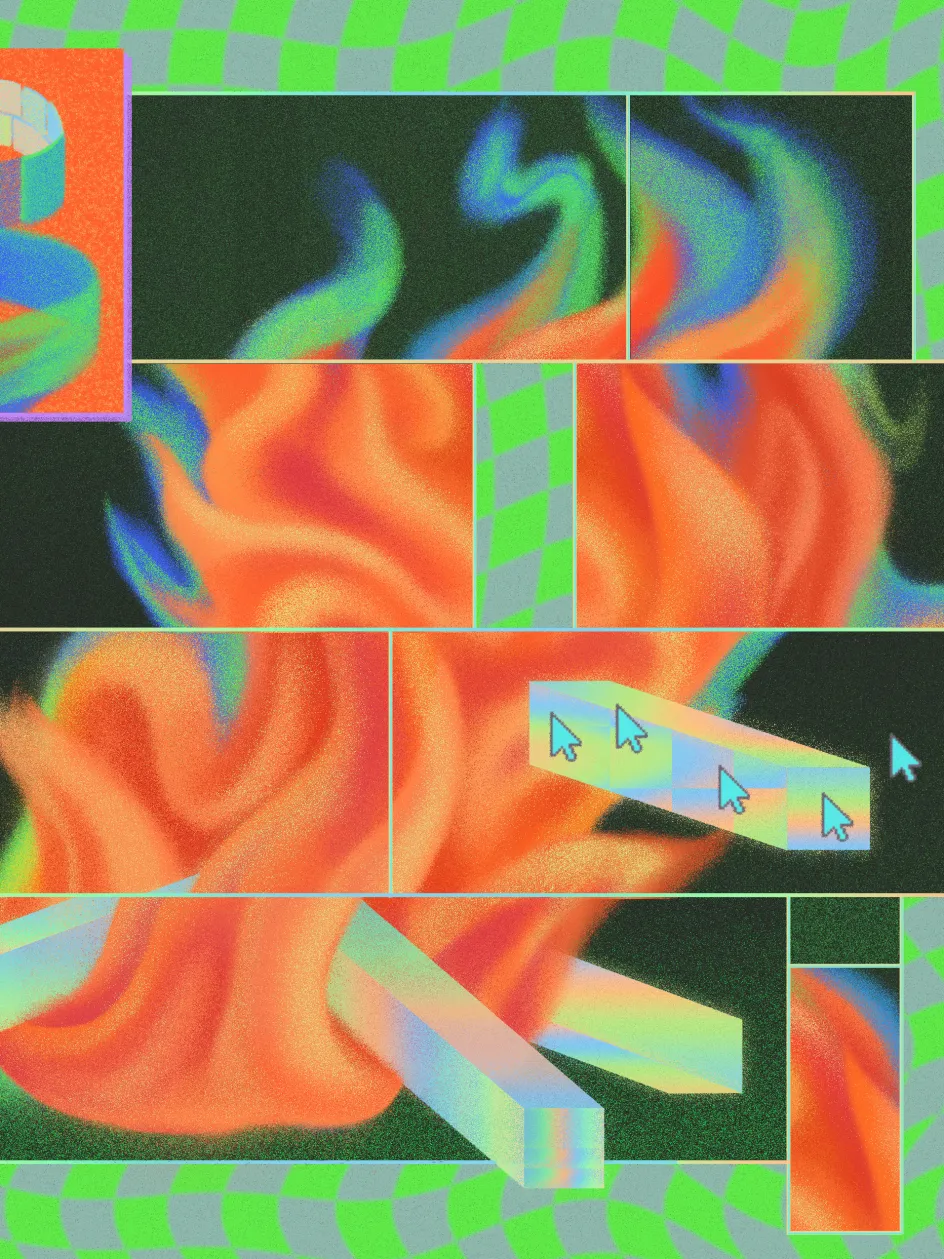
SAIMAN CHOW
The future of open source is still very much in flux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미래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는 기술 산업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건전하고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980년 제록스(Xerox)가 MIT 인공지능연구소(MIT Artificial Intelligence Lab)에 새 레이저 프린터 한 대를 기증했을 때, 제록스는 이 기계가 혁신에 불을 지피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 프린터는 종이가 걸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27세로 MIT의 프로그래머였던 리처드 스톨먼(Richard M. Stallman)은 2002년에 발표한 자신의 저서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Free as in Freedom)》에 이 프린터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를 파헤치려고 했다고 적었다. 스톨먼은 이전 프린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초기 수십 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일반적으로 오픈 액세스와 자유로운 교환 문화 중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엔지니어들이 시간대와 소속 기관을 초월해서 서로의 코드를 살펴보고 그 코드를 자신의 코드로 만들거나 거기서 몇 가지 버그를 수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새 프린터는 자유로운 접근이 불가능한 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 또는 사유 소프트웨어) 기반이었다. 스톨먼은 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없었고, 제록스가 공개적인 코드 공유 시스템을 위반한 것에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