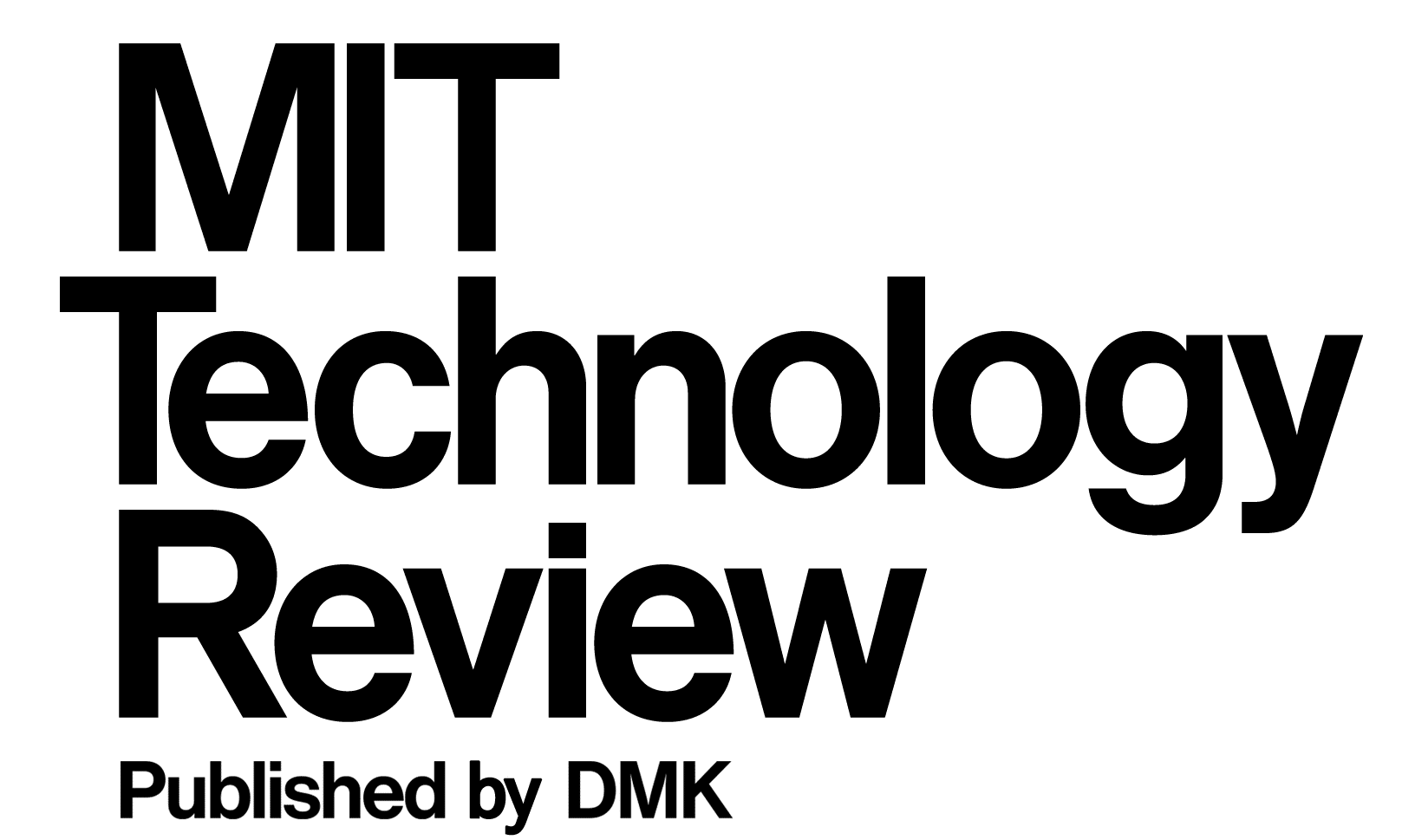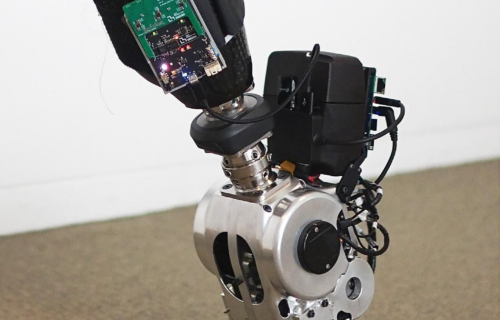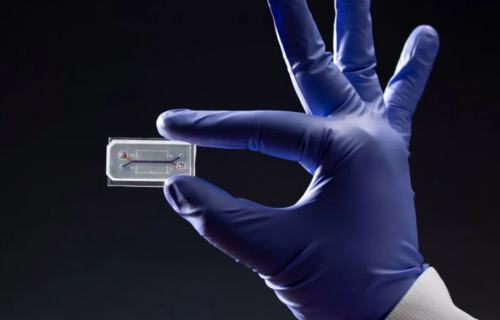인생을 바꾼 뇌 임플란트를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
때에 따라서 환자가 누리는 삶의 질은 질병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보다 뇌에 삽입한 전극에 의해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다.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뇌 임플란트를 이식받아 자기 주체성과 자아의 변화를 겪었던 한 호주 여성 리타 레깃(Rita Leggett)의 사례를 들어 보자. 레깃은 연구자들에게 그녀와 기기가 ‘일체화됐다’고 말했다.
이식 후 2년이 지나 레깃은 임플란트 제작사의 파산으로 인해 기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서 윤리학자들은 사람에게서 뇌 임플란트와 같은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뇌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고 레깃처럼 임플란트를 이식받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 마련이 시급해질 것이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뮌헨 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의 마르첼로 이엔카(Marcello Ienca)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논문에서 이엔카와 그의 동료들은 “기술 덕분에 새로 태어난 그녀가 이후 기기 제거를 강요당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했다. 그리고 “회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식된 기기를 제거했고, 기기를 제거하자마자 새 사람은 소멸했다”라고 언급했다.
레깃은 뇌전증 환자를 돕기 위해 고안된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을 통해 기기를 이식받았다. 그녀는 겨우 3살 때 중증 만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평소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