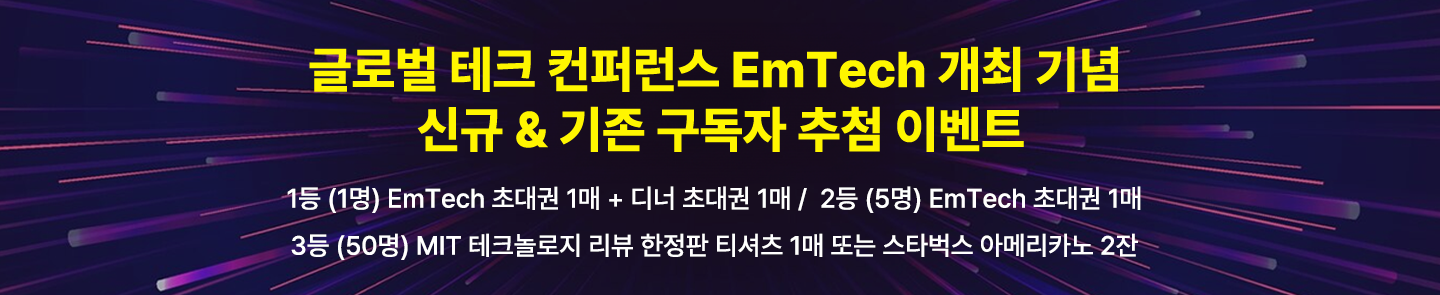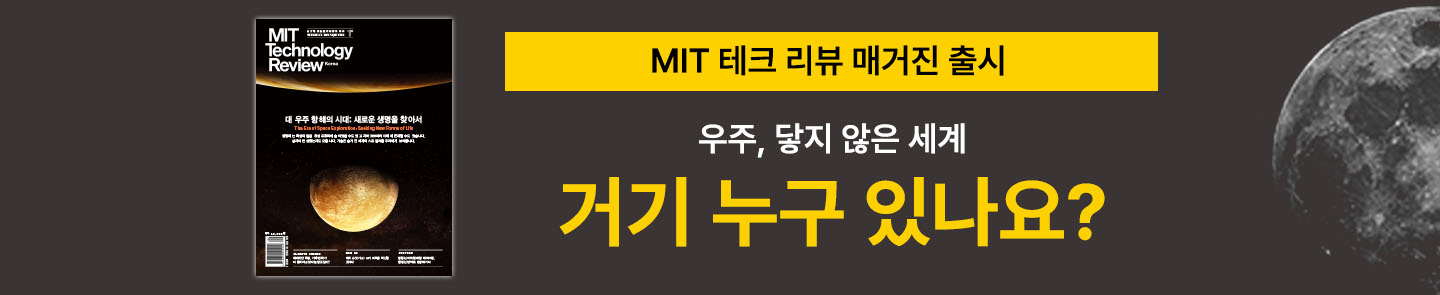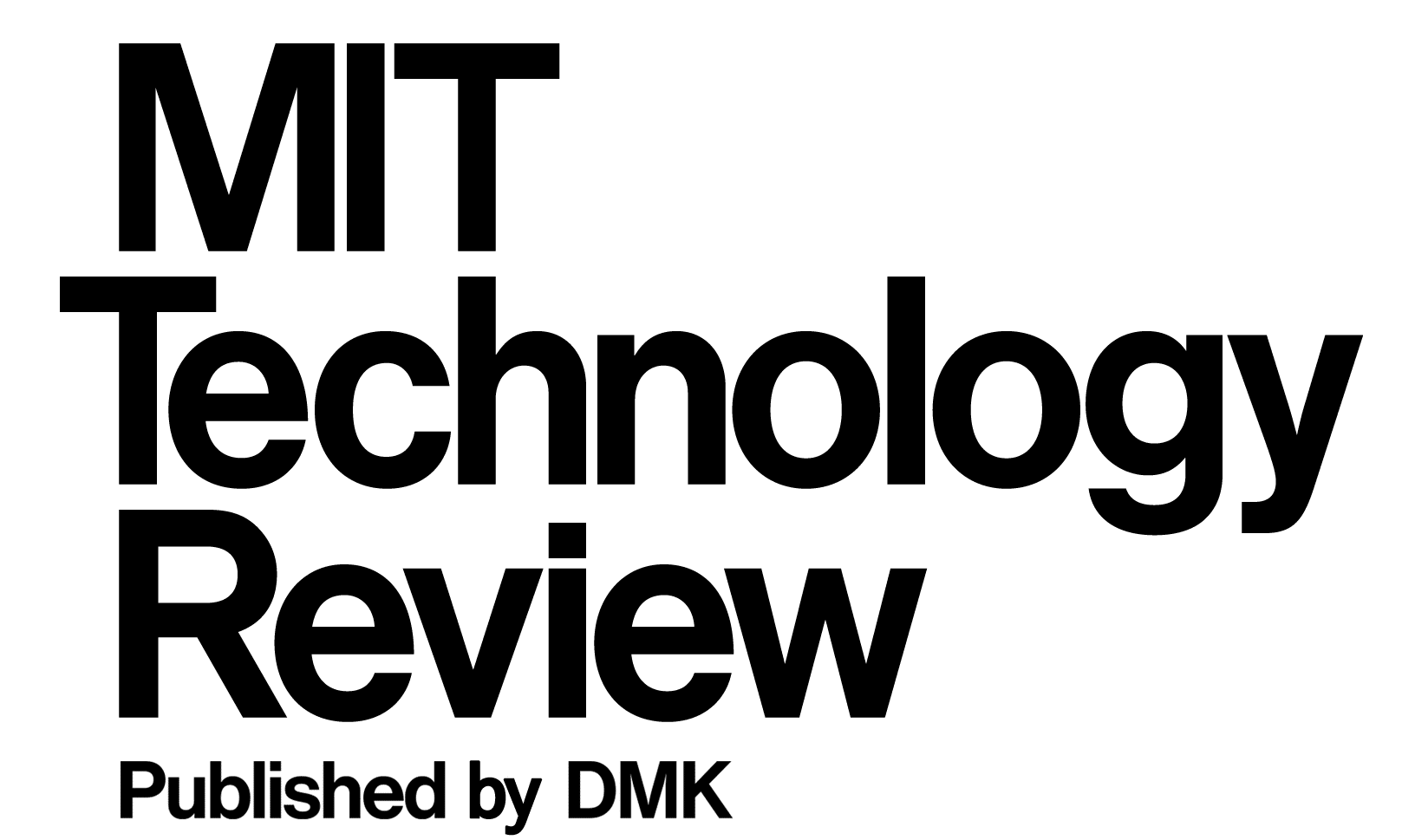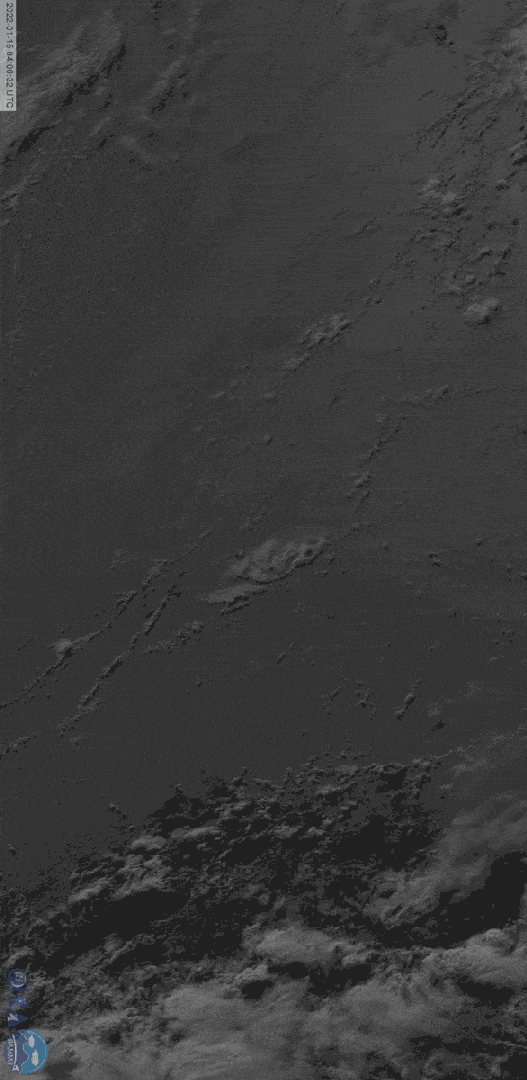
Tonga’s volcano blast cut it off from the world. Here’s what it will take to get it reconnected.
해저화산 폭발로 인터넷 끊긴 통가…세상과 단절 위기
해저화산 폭발로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가 세상과 단절될 위기를 맞게 됐다. 통가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인터넷이 끊겼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끊기자 통가의 정확한 피해 상황이 외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통가 정부와 세계 각국과 원조 활동 등을 위한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연결이 복원되기까지 길게는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때까지 통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해저화산 ‘훙가 통가-훙가 하파이(Hunga Tonga–Hunga Ha‘apai)’는 지난 13년 동안 이미 여러 차례 폭발했지만 이번 달 15일 일어난 폭발이 가장 파괴적이었다. 이 폭발로 6,000마일 이상 떨어진 페루에서도 쓰나미(해일)가 발생해 여성 2명이 해변에서 익사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가 화산 폭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번 폭발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로 통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통가의 인터넷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가 정부와 세계 각국 사이에 구호나 구조 작업 역시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인터넷이 끊기자 통가는 이제 철저히 고립됐고, 외부로 소식을 알리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통가의 인터넷 연결을 복원해야 하지만 그러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