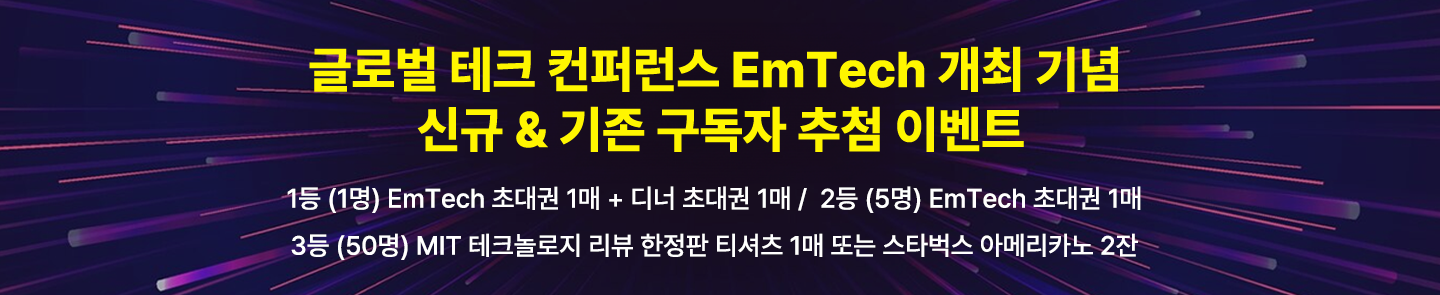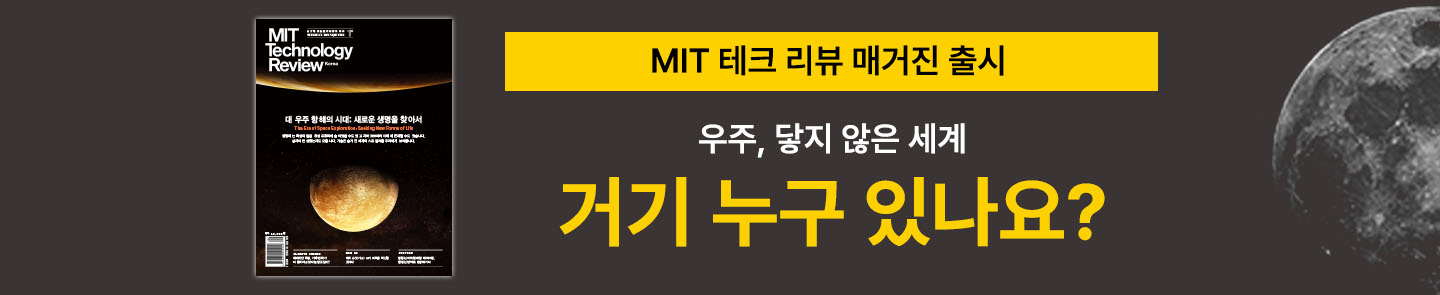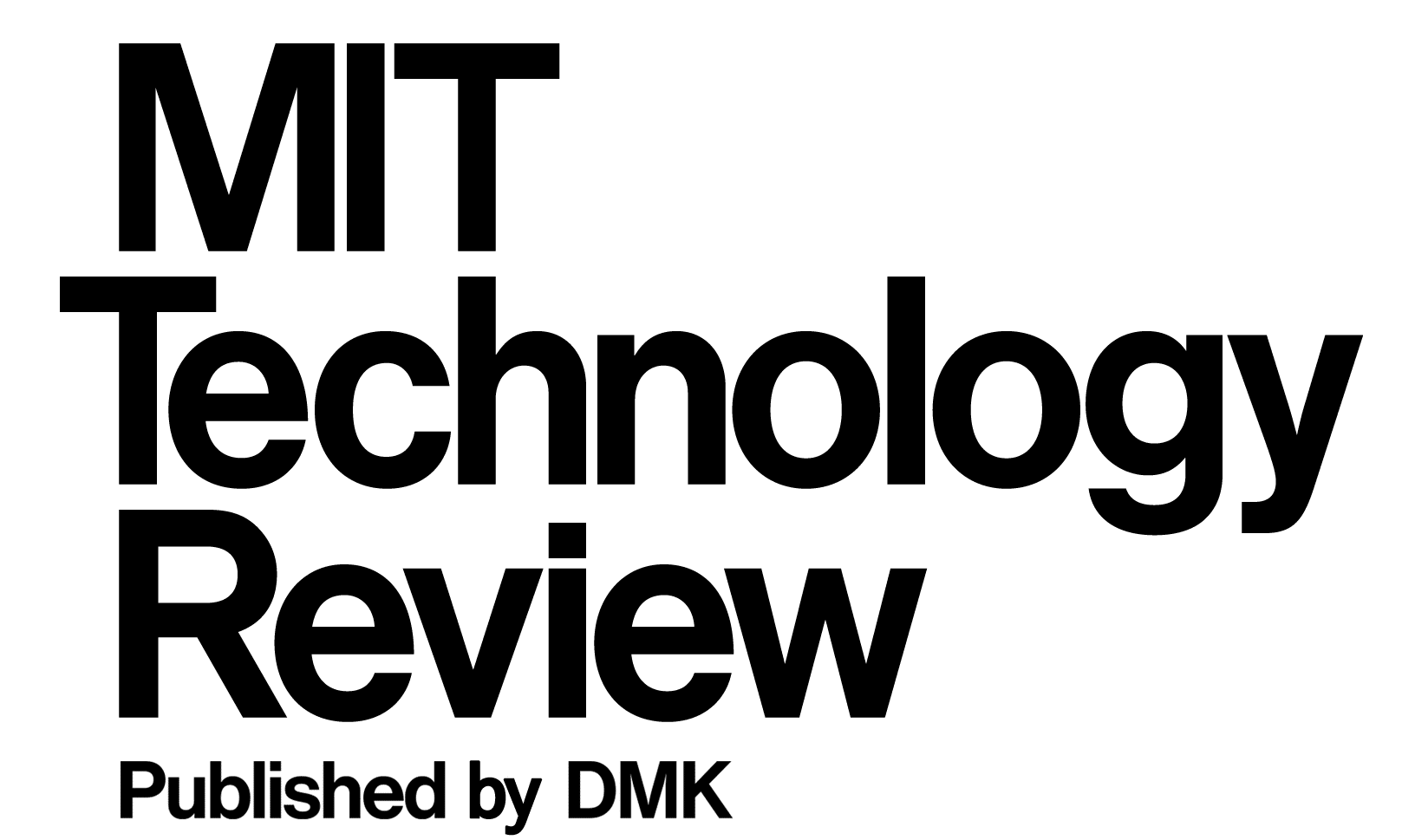Why the definition of design might need a change
디자인의 재정의
‘디자인design’이라는 단어의 현대적인 의미를 풀이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 단어를 재정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계(design, 또는 디자인)’라는 단어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건축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디세뇨(disegno)’, 즉 ‘그림(drawing, 또는 도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적어도 1990년대 말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내가 들었던 열정적인 설명에 따르면 그렇다. 물론 역사 속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하다. 1300년부터 1500년 사이 ‘설계’의 의미에 실제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는 언어보다는 사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과 더 관련이 있었다. 그림과 설계의 관계는 단어를 탄생시키지도, 그 의미를 확장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전에 사용됐던 것처럼 단어의 의미를 축소시켰고, 이제는 그렇게 축소된 의미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design’의 라틴어 어원인 ‘데 시그노(dē-signo)’는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Cicero)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미들을 전달했다. 데 시뇨의 뜻은 문자적인 의미에서부터 투사(tracing)와 같이 소재와 관련된 의미, 목표를 구상하고 달성한다는 전술적인 의미를 지나, 사람과 사물을 전략적으로 ‘지정(designation)’하는 것처럼 단어 자체에 ‘design’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의미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미에는 만들고 배치하면서 세계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넓은 개념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