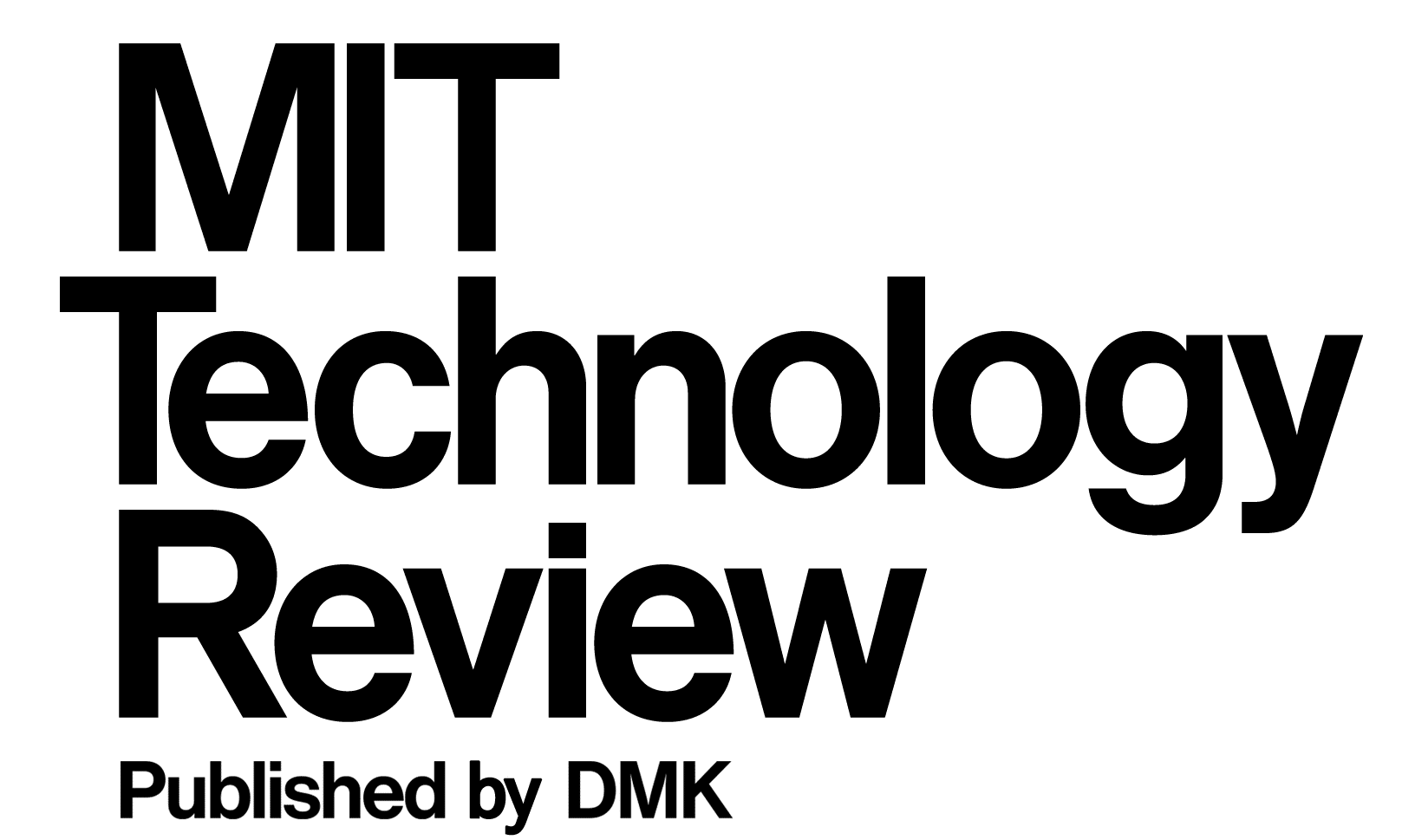글로벌 인터넷 백본망. (출처: https://www.itu.int/itu-d/tnd-map-public)
Russia-Ukraine war is accelerating the splinternet phenomenon
스플린터넷: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라지는 인터넷
지구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인터넷은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서 국경에 따라서 분할될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이 내놓은 강력한 제재 조치와 러시아의 반발은 인터넷의 파편화 또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미국 인터넷 백본 제공업체는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IP주소를 회수하기로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러시아 관영 매체를 제한하자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분열되는 인터넷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불거진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은 인터넷이 민주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로 나뉘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 또는 사이버 발칸화(cyberbalkanization)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은 경제 제재의 일부로서 러시아의 인터넷을 고립시키기 원하고, 러시아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러시아 내에서 차단하고 강력한 허위 정보법을 시행 중이다. 서방과 러시아 두 진영이 취하는 공격적 조치들은 ‘인터넷의 파편화’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인터넷은 점차 글로벌 인터넷망에서 분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터넷을 자유주의 진영의 개방형 모델과 비자유주의 국가들(러시아, 이란, 중국) 등 폐쇄형 모델로 고착화 시킬 수 있다. 글로벌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로컬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 의견의 교환, 넓은 세계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지만 권위주의 국가가 온라인 콘텐츠를 통제하거나 관영 매체의 뉴스를 대중에게 주입하기는 쉬워진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러시아의 인터넷은 비교적 자유로웠고 모스크바 시민들은 전 세계인이 보는 것과 동일한 온라인 세계를 서핑할 수 있었다. 러시아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소셜 미디어로 업데이트 되는 서방 미디어의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