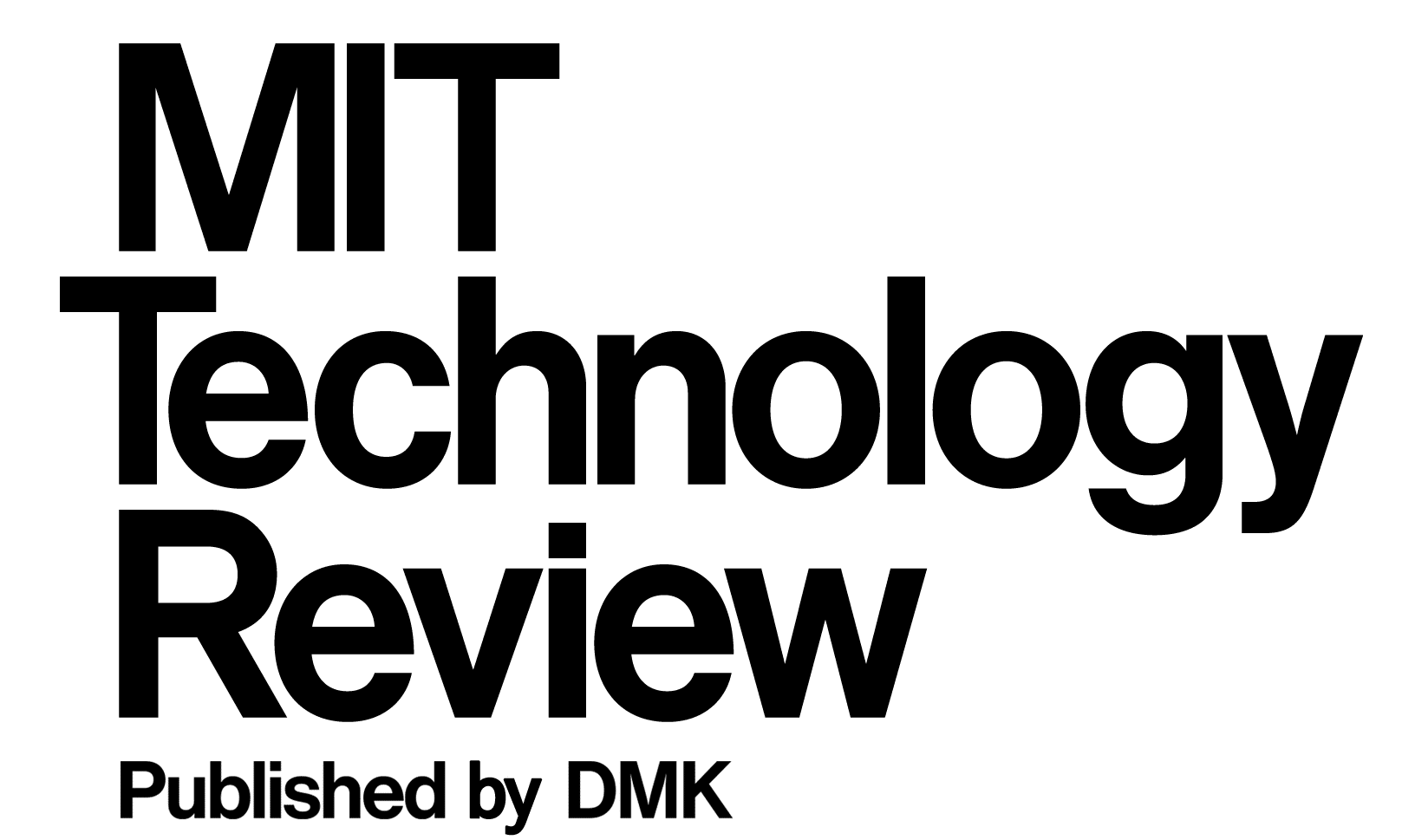‘똑똑한 도시’가 아니라 ‘더 똑똑한 도시’가 필요하다
‘스마트시티(smart cities)’라는 용어는 원래 대형 IT 업계의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 이 단어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신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뜻할 때 쓰인다. 하지만 도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5G 통신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다. 도시는 기회, 번영, 진보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도시는 전쟁과 다양한 위기에서 벗어나 도망쳐 온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며, 동시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생산해내는 곳이기도 하다. 2050년이면 세계인구의 68%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금보다 25억 명 더 늘어난 수치다. 또한 도시는 90% 이상이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기도 하다.
자칫 ‘스마트시티’ 건설에만 매진하는 관점에서는, 도시를 단순히 기술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도시의 거주민이 아니라 도시의 ‘사용자’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다. 이 경우 거주민보다는 도시의 월간 및 ‘일간 사용자(daily active)’ 수에, 시민보다는 구독자와 주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인 이득과 눈으로 보이는 숫자에만 집착하여 도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스마트시티’는 도시 구성원과 그들의 인생이 IT ‘솔루션(solutions)’만으로 규정되거나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진정한 도시는 구성원들의 재능, 상호 관계, 주인의식에서 비롯되며, 단지 도시 조성에 활용된 기술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